[남정욱의 명랑笑說]
머리 맑아야 좋은 글 나와
"잘 쓰겠다" 욕심도 버려야
마지막 비결?
뜻대로 안 써져도 좌절하거나 슬퍼하지 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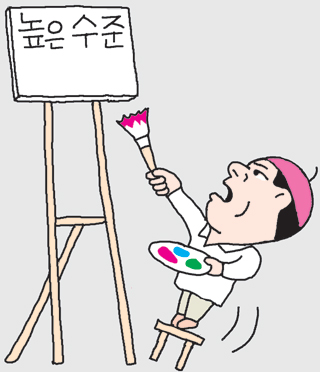
글쓰기 강연 요청이 들어왔다. 수락하고 전화를 끊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른 건 이런 광고 카피였다. '운전은 한다. 차는 모른다.' 딱 그 꼴이다. 글은 쓴다. 그걸로 밥도 먹고 술도 먹는다. 그러나 그게 다다. 글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혹시나 해서 답이 들어 있을 법한 책부터 찾아봤다. 스티븐 킹의 '유혹하는 글쓰기'와 하루키의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다. 그럴 줄 알았다. 자기 자랑만 늘어놓거나(스티븐 킹) 어쩌다 보니 소설가가 되었다는(하루키)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뿐이다. 머리만 더 복잡해졌다. 아니 더 나빠졌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쓰는 걸까로 시작했는데 조금 지나자 그럼 대체 나는 어떻게 쓰는 것일까로 문제가 심오해진 것이다.
이인성의 소설 '한없이 낮은 숨결'에 야구 선수가 슬럼프에 빠지는 과정을 고백하는 대목이 나온다. 짧아서 그대로 옮긴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저 공을 어떻게 쳐냈던가 의심이 들더니… 야구공 지름이 몇 센티나 됩니까… 그게 보통 시속 백킬로 이상으로 휙휙 날아드는데… 피처가 공을 놓은 순간부터 0.25초 안에 칠까 말까를 결정해서 0.2초 안에 배트를 휘둘러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는 순간 동물적인 감각이 사라진다는 얘기다. 주변에 미운 야구 선수가 있으면 들려줘도 좋겠다. 뒷일은 책임 못 진다.
글 쓸 때 원칙이 있기는 하다. 일단 글을 잘 쓰겠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 썼던 글 중 엉망인 것들을 보면 하나같이 욕심이 덕지덕지 붙은 글이다. 지식과 통찰이 절묘하게 배합된 글을 쓰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다. 그러나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인간은 제 수준에 맞는 글만 쓸 수 있다. 그리고 잠을 푹 자야 한다. 잠을 못 자면 글이 나빠진다. 못 자면 여성들 피부가 나빠지는 것과 비슷한 원리다. 해서 마감이 다가오면 일단 어떻게든 잔다.
이인성의 소설 '한없이 낮은 숨결'에 야구 선수가 슬럼프에 빠지는 과정을 고백하는 대목이 나온다. 짧아서 그대로 옮긴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저 공을 어떻게 쳐냈던가 의심이 들더니… 야구공 지름이 몇 센티나 됩니까… 그게 보통 시속 백킬로 이상으로 휙휙 날아드는데… 피처가 공을 놓은 순간부터 0.25초 안에 칠까 말까를 결정해서 0.2초 안에 배트를 휘둘러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는 순간 동물적인 감각이 사라진다는 얘기다. 주변에 미운 야구 선수가 있으면 들려줘도 좋겠다. 뒷일은 책임 못 진다.
글 쓸 때 원칙이 있기는 하다. 일단 글을 잘 쓰겠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 썼던 글 중 엉망인 것들을 보면 하나같이 욕심이 덕지덕지 붙은 글이다. 지식과 통찰이 절묘하게 배합된 글을 쓰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다. 그러나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인간은 제 수준에 맞는 글만 쓸 수 있다. 그리고 잠을 푹 자야 한다. 잠을 못 자면 글이 나빠진다. 못 자면 여성들 피부가 나빠지는 것과 비슷한 원리다. 해서 마감이 다가오면 일단 어떻게든 잔다.
맑은 글은 맑은 머리에서만 나온다. 마지막은 죄를 짓지 않는 거다. 죄를 지으면 마음이 어수선해서 집중이 안 된다. 나름대로 정리는 했는데 문제는 이게 전혀 대중 강연용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욕심을 자제하고 잠을 잘 자고 죄를 짓지 마세요'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내가 더 궁금하다. 그렇다고 아는 얘기를 써라, 주제에 집중해라같이 하나 마나 한 소리를 지껄이고 싶지는 않다(다들 아는 얘기를 쓴다. 다들 주제에 집중한다. 다만 잘 안 될 뿐이다).
우연히 시작한 글쓰기라 그동안 밑천 안 들이고 장사하는 기분이었다. 어떻게 팔아도 항상 남았다. 작년 겨울, 난생처음으로 글을 좀 더 잘 썼으면 하는 욕심이 생겼다. 사람 얼굴이 다 다르다지만 계속 덜어내다 보면 결국 원과 점 두 개, 그리고 선 네 개만 남는다. 그런 글을 쓰고 싶었다(미술 하는 사람들이 구상에서 추상으로 옮겨가는 이유와 비슷하다).
우연히 시작한 글쓰기라 그동안 밑천 안 들이고 장사하는 기분이었다. 어떻게 팔아도 항상 남았다. 작년 겨울, 난생처음으로 글을 좀 더 잘 썼으면 하는 욕심이 생겼다. 사람 얼굴이 다 다르다지만 계속 덜어내다 보면 결국 원과 점 두 개, 그리고 선 네 개만 남는다. 그런 글을 쓰고 싶었다(미술 하는 사람들이 구상에서 추상으로 옮겨가는 이유와 비슷하다).
팩트를 나열한
뒤 교훈이나 생각할 거리를 덧붙이는 빤한 글 말고 뭔가 다른 글. 그러면서도 평민들의 파티에 나타난 공작 부인 같은 글. 실패했다. 애초에 없었거나 내가 갖기에는 너무 멀리 있는 글이었다. 높은 데만 바라봤더니 그나마 쓰던 글도 안 써졌다. 원칙 하나가 더 생겼다. 뜻대로 안 되더라도 좌절하거나 슬퍼하지 않기. 아, 역시 강연용은 아니다. 정말 고민된다.
남정욱 숭실대 문예창작학과 겸임교수 조선일보 입력 : 201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