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민호의 레저터치

해 뜰 녘의 제주 중산간. 다랑쉬오름 중턱에서 지미봉을 바라봤다. 김영갑이 '삽시간의 황홀'이라고 표현했던 찰나의 아름다움이다. [중앙포토]
용눈이오름 굼부리(분화구) 모서리에 걸터앉았다. 예의 그 제주 바람이 지나갔다. 윙윙 소리 내며 바람이 오니, 서걱서걱 억새가 장단을 맞춘다. 바람은 익숙한데 사위는 낯설다. 바람 소리보다 사람 말소리가 더 자주 들린다. 10년 전만 해도 팔베개하고 누워 잠이 들었는데…. 반대편 굼부리 능선 너머로 해가 진다. 저 변덕 심한 하늘은 낯익다. 15년 전 가 버린 사내의 사진에서 여러 번 본 적이 있다. 삽시간의 황홀이라 했던가.

김영갑은 용눈이오름의 곡선을 사랑했다. [사진 김영갑갤러리 두모악]

김영갑이 바라봤던 용눈이오름의 곡선을 바라봤다. 능선을 따라 탐방로가 나 있고 탐방로를 따라 관광객이 거닌다. 손민호 기자
용눈이오름은 이제 제주도를 대표하는 관광지다. 오름 자락 소똥도 치워졌고, 능선 따라 야자나무 매트도 깔았다. 오름 어귀엔 화장실 딸린 주차장도 들어섰다. 그래, 다 좋다. 그래도 오름 아래를 맴도는 레일바이크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철도의 역사가 없는 제주도와 폐철로를 달리던 레일바이크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조만간 이 중산간에 동물원도 지을 참이란다. 오름에 소가 사라지자 코끼리가 들어오는 것인가. 너무 빨리 변하는 세상이 무섭다.

사진작가 고 김영갑. 김영갑이 마지막 남긴 얼굴 사진이다. 권혁재 사진전문기자
5월 29일은 고(故) 김영갑(1957∼2005) 15주기다. 18년간 중산간을 헤매며 오름 사진을 찍다 루게릭병에 걸려 죽은 사람. 그를 기리려 다시 오름에 올랐다. 나는 2003년 그를 세상에 알린 인연으로 형님 동생 사이가 되었고, 2005년 그의 부고를 썼다. 죽을병에 걸린 사람이 죽었으니 담담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엉엉 소리 내 울다 겨우 부고를 넘겼다. 부고를 쓴 업으로 5주기와 10주기에 오름 여행을 기획했고, 15주기에도 오름 밭에 들었다. 마음은 한 가지였다. 제사상에 술 한 잔 올리는 것. 나 말고는 딱히 추억하는 사람도 없다.
이번에도 김영갑갤러리 ‘두모악’의 박훈일(52) 관장을 따라다녔다. 5주기에도, 10주기에도 그를 앞장세웠다. 박 관장은 김영갑이 세상에 남긴 유일한 제자다. 김영갑이 제주에 정착한 1985년, 그의 첫 하숙집 막내아들이 지금의 박 관장이다. 고등학생의 눈에는 허구한 날 카메라 메고 쏘다니는 “영갑 삼촌”이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었다. 그를 따라 다녔고, 그가 떠나고 갤러리를 물려받았다.
“선생님(이제 박 관장은 ‘형님’을 ‘선생님’이라 부른다)이 돌아가신 해 서울에서 전시회를 두 번 했었어요. ‘내가 본 이어도’ 연작 전시회였는데 첫 회 주제가 용눈이오름이었어요. 그때 전시에 올린 작품을 15주기에 맞춰 다시 전시하려고 합니다.”
눈, 비, 안개, 바람, 구름. 15년 전 전시회의 주제다. 이를테면 ‘구름이 내게 가져다준 행복’ 같은 구절로 쓰였다. 구름 따위가 무슨 행복을 가져다준다고. 중산간에서 당근 뽑아 먹으며 견뎠으면서…. 지금은 제법 알려졌지만, 생전의 김영갑은 무명작가였다. 사진을 전공하지 않았고 상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그는 죽고서 유명해졌고, 그가 죽고서 그가 사진에 담았던 오름도 유명해졌다.

손자봉 기슭에서 내다본 동검은이오름 알오름 군락지. 원시의 중산간이 펼쳐지는 비경이다. [사진 김영갑갤러리 두모악]

동검은이오름 알오름 군락에서 바라본 다랑쉬오름. 손민호 기자

동검은이오름 알오름 군락. 초원이 강아지풀꽃과 개민들레꽃으로 덮여 있다. 손민호 기자
동검은이오름 아랫자락 알오름 군락지에 들었다. 이 광활한 초원은 제주도 주민도 잘 모르는 비경이다. 여러 번 나도 발을 들였었지만, 박 관장이 앞장서지 않으면 엄두를 못 낸다. 쉼 없이 이어지는 올록볼록한 언덕이 하얀 강아지풀꽃과 노란 개민들레꽃으로 반짝인다. 황소 여남은 마리가 멀찍이서 풀을 뜯고, 군데군데 산담 두른 무덤이 단추처럼 박혀 있다. 사람과 자연이, 삶과 죽음이 어우러진 원형 그대로의 중산간이 고스란하다. 여태 그대로여서 차라리 감사한 풍경. 다시 예의 익숙한 바람이 불어왔고, 이번엔 바람 소리가 더 가까이 들렸다. 꽃길이 아니라 꽃밭만 있을 뿐이어서 어쩔 수 없이 두 발로 꽃길을 냈다.

둔지봉에서 바라본 해 뜰 녘의 다랑쉬오름. 생전의 김영갑이 가장 아끼던 시간이자 공간이다. 손민호 기자

둔지봉 아래에 펼쳐진 무꽃밭. 손민호 기자
둔지봉 아래에는 무꽃이 한창이었다. 무꽃 흐드러진 풍경은 슬프다. 무를 뽑지 않았다는 뜻이어서다. 내버려 둔 것, 외면당한 것, 나아가 저버린 것들은 왜 하나같이 아름다운가. 어쩌다 김영갑은 이 서러운 풍경을 붙들다 갔는가. 한라산처럼 크고 높은 화산이 되지 못한 오름에는 왜 죄다 낮고 작은 삶들만 모여 있는가. 둔지봉은 죽기 전의 김영갑이 마지막까지 그리워했다는 오름이다.

김영갑갤러리 앞마당의 조각상. 생전의 김영갑을 닮은 이 조각상 아래에 김영갑의 뼛가루가 뿌려졌다. 손민호 기자
15년이란 시간을 생각한다. 고집불통 사진작가가 죽고서 흘러간 세월. 무엇이 변하고 무엇이 남았을까. 당신이 남긴 사진에 홀려 사람들이 오름을 알았고, 사람들이 오름에 남긴 흔적으로 당신의 자국이 지워지고 있다. 저승의 당신, 흐뭇하신가 섭섭하신가. 갤러리 입장객이 줄고 있다는 소식은 들으셨는가.
형님이 이승에서 잊히는 건, 형님이 다시 일어서지 않는 것처럼 분명한 사실이다. 하니 아쉬어 마시라. 돌아보니 형님보다 한 살을 더 먹었다. 형보다 늙은 동생이 되고 말았다. 아무래도 20주기 기사는 못 쓸 것 같다. 이 또한 서운해 마시라. 용눈이오름에 바람 불어오면 형님 왔다 가신 줄 알겠다.
레저팀장 ploveson@joongang.co.kr [중앙일보] 입력 2020.05.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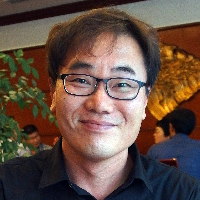
손민호 기자
◇여행정보=제주 김영갑갤러리 ‘두모악’에서 6월 1일부터 15주기 기념 전시회를 연다. 전시회는 연말까지 이어진다. 제주도에는 368개나 되는 오름이 있다. 제주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제주관광정보 홈페이지(visitjeju.net)에 오름 195개에 관한 여행정보가 모여 있다. 골라서 다녀보시라.
'사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수정인 듯 꽃인 듯 '나도수정초' (0) | 2020.06.15 |
|---|---|
| 월간山X마무트 사진 공모전 - 산사진 공모전 최종 수상작은? (0) | 2020.05.27 |
| 헬리콥터에서 내려다본 전 세계 아름다운 해변 (0) | 2020.05.13 |
| 자연사진 공모전 ‘빅픽처 2020’ 수상작 발표 (0) | 2020.05.06 |
| 세계서 가장 선명한 달 공개 (0) | 2020.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