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부한 예술성·과학지식 무장한
일러스트레이터 로런 레드니스
기묘한 날씨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
환상적 그림과 함께 펼친 그래픽 북
자연재해, 신비로운 기후, 날씨
역사 문화 정치 연결 ‘종횡무진’


아주, 기묘한 날씨
로런 레드니스 글·그림, 김소정 옮김/푸른지식·2만2000원
로런 레드니스 글·그림, 김소정 옮김/푸른지식·2만2000원
한 사람이 쓰고 그린 책이 종종 보인다. 대개 동화나 수필이다. 감성을 건드리는 분야이기에 글과 그림이 자연스럽게 융합한다.
<아주, 기묘한 날씨>는 통념을 깬다. 감성적인 그림과 날씨라는 이지적인 글감이 기묘하게 동거한다. 완결적인 그림과 글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 밀고 당긴다고 할까. 글 자체가 완결적임은 물론 그림이 때로 삽화 형태로, 때로 한 페이지에 완결된 작품 또는 몇 페이지에 걸친 시리즈로 존재한다. ‘하늘’처럼 그림으로 하나의 장을 오로지하기도 한다. 도저한 자신감이다.
지은이는 로런 레드니스.

뉴욕 파슨스 디자인 스쿨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을 가르치는 그림쟁이다. 전문가이니 그림이 볼만한 것은 당연한 일. 동판과 폴리머판을 활용한 에칭 기법으로 손맛을 살린 선화에다 색을 입혔다. 지은이가 세계 미술 트렌드의 최전선에 머무는 만큼 표현 방식과 기법이 무척 세련됐다. 책의 만듦새에서 반은 먹고 들어가는 셈이다.
문제적인 부분은 글이다.
그림쟁이가 쓴 것이니 한 수 접어줄 생각으로 읽었는데, 몇 장을 넘기면서 뭔가 잘못됐음을 알았다. 이걸 그림쟁이가 썼다고? 도저히 믿기지 않아 하다가 책을 덮으면서 ‘내가 졌다’는 항복선언을 했다. 그림쟁이는 글을 못 쓴다거나, 쓴다 해도 감성적인 소재에 국한된다는 생각이 한국 출판계의 형편에서 비롯한 편견임을 인정해야 했다. 날씨라 하니 추위, 비, 안개, 바람, 열, 하늘, 일기예보 따위의 소주제는 그렇다 치자. 후반으로 가며 날씨와 관련된 통치, 전쟁, 수익, 즐거움으로 확대되는 데 이르러서는 ‘뭐, 이런 사람이 있어?’라는 중얼거림이 튀어나온다. 기상전문가 또는 글쟁이가 썼다고 해도 믿을 수밖에 없다. 어쩌면 한 수 위라는 느낌이다. 뻥치지 말라고?

예컨대 ‘추위’.
“이누이트는 잠을 잘 때 안구가 빠져나와 여행한다고 믿는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는 것은 안구가 여행하기 때문이다.” 지은이는 북극탐험가 빌햐울뮈르 스테파운손의 <친근한 북극, 극지방에서 보낸 5년>(뉴욕 맥밀런출판사, 1921)에서 뽑은 인용구로 시작한다. 극지는 온통 하얘 앞뒤 거리를 가늠할 수 없는 탓에 5~6미터 간격으로 장갑을 던져 나아감의 정도와 방향을 인지해야 한다, 선글라스가 없던 당시 설맹에 걸리지 않으려 가느다란 틈을 낸 고글을 썼다는 이야기를 소개한다. 이어지는 스발바르 제도. 북극에서 660해리 떨어진 동토의 섬. 포경기지를 지키려 자유를 미끼로 사형수를 이주시켰다는 곳이다.
<북극에서 밤을 보낸 여인>(알래스카대출판부, 1954), <누군가에게는 죽음도 휴식이 아니다>(밀워키저널, 1985) 등에서 겨울에는 망자를 묻지 않고 오두막에 둔다, 땅에 묻은 관이 시간이 지나면 지표면으로 올라온다는 증언을 인용한다. 추위는 그곳을 천연냉장고로 만들어 세계적인 종자보관소가 존재하며 그곳에 한국의 참깨, 시금치, 땅콩, 토마토, 당근, 율무 씨앗이 맡겨져 있음을 전한다. 스발바르 제도의 가장 큰 정착촌. 한 카페에서 일하는 여성의 인터뷰로 고래, 순록, 물개 고기에 신물 나 하는 주민 표정을 생중계한다. 이 밖에 지은이가 기댄 참고문헌은 많은데, 이들은 현장조사와 인터뷰에서 뽑은 내용과 치밀하게 조응한다.

보통 추위라면 온습도, 체감, 눈보라 아닌가. 한 걸음 나아가면 저체온증, 동사, 빙하기 등을 거론할 법하다. 한데 지은이는 ‘꼰대스런’ 개념 소개를 훌쩍 뛰어넘어 북극으로 푹 들어간다. 지은이가 인용한 스테파운손은 한국으로 치면 3·1운동 2년 뒤에 나온 책인데 그것을 어떻게 찾아내 인용구를 어떻게 뽑아냈는지 신기하다. 유명 브로드웨이 쇼 ‘지그펠드 폴리스’에 출연한 마지막 코러스걸 도리스 이턴 트래비스의 이야기를 다룬 <세기의 소녀>와 마리·피에르 퀴리 부부를 소재로 한 <방사능>이라는 전작으로 미루어 지은이의 관심이 전방위에 걸쳐 있음을 알 수 있다.
별종 그림쟁이다. 어떻게 다양한 분야를 천착할 수 있는지, 무엇보다 워킹맘으로서 어떻게 책 쓰는 데 시간을 할애할 수 있었는지 많은 궁금증을 부른다. 더군다나 원서의 글꼴은 글의 내용과 최대한 어울리는 형태로 지은이가 자신의 손글씨를 바탕 삼아 아예 직접 새 서체를 만든 것이라고 한다. 번역서는 원서의 느낌을 최대한 살리려 필기체의 컴퓨터 글꼴을 썼다.

후반부에 등장하는 ‘전쟁’을 보자.
날씨 조작은 베트남 전쟁에서 처음 활용됐다. 1963년 베트남 승려들의 시위를 해산하기 위해 미국 중앙정보국(CIA)에서 비를 내리게 했다는 것. 여기서 효과를 본 미국은 홍수를 일으켜 다리를 무너뜨림으로써 월맹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데 활용하기에 이른다. 현재 미국은 <전력 증강자로서의 날씨: 2025년 날씨를 장악하라>는 보고서를 내어 안개를 흩트리는 레이저, 번개를 막을 수 있는 비행기, 구름씨를 뿌릴 수 있는 무인비행기 등 ‘날씨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소개한다. 재밌기는, 애초 구름응결 기술을 개발한 연구진에 미국 소설가 커트 보니것의 형이 포함됐다는 사실. 초기 날씨 조작 연구자가 2차대전 때 드레스덴 폭격의 참상을 직접 경험하고 이를 소재로 한 반전소설 <제5도살장>을 쓴 소설가와 형제지간인 게 아이러니하다. 금시초문의 이야기는 쭉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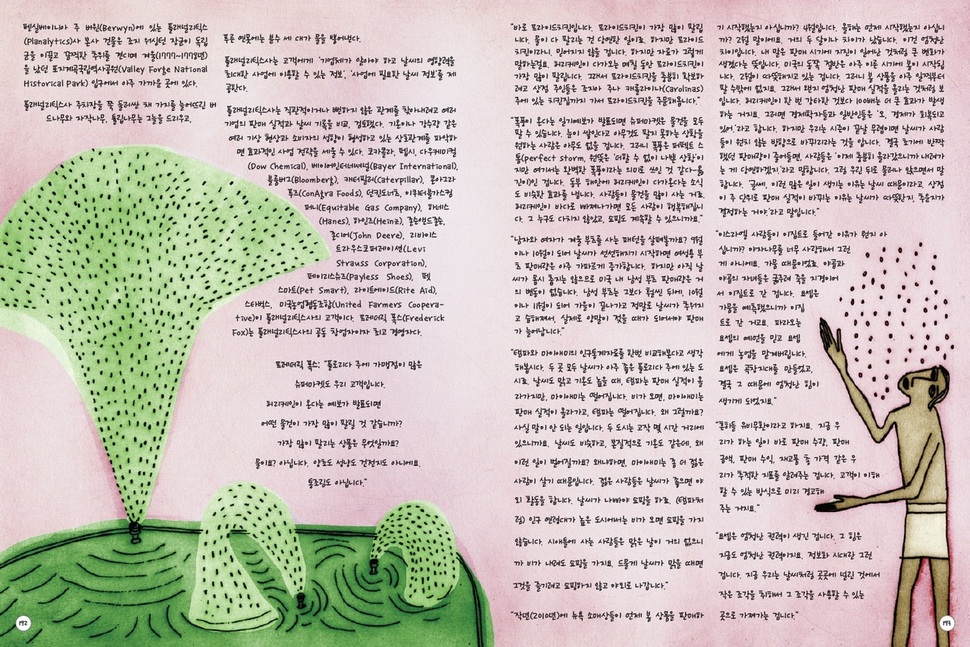
번개를 맞았을 때 꽉 막힌 운동화를 신고 있다면 신발이 폭발하여 날아가버린다는, 스모그가 극성스럽던 1950년대 런던에서 구급차는 차 밖으로 안내인을 동반했다는, 중부 유럽의 푄바람은 두통·불면증을 불러 스위스 판사들은 푄이 부는 동안 일어난 범죄를 심판할 때 양형을 고려한다는, 중세 마녀사냥이 소빙하기에 따른 기상이변과 관련 있다는, 달궈지는 지구를 식히려 성층권까지 뽑아올린 파이프를 통해 이산화황을 비산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 등등.
날씨가 돈임은 짐작하지만, 빅데이터 활용 실태는 놀랍다.
플로리다 슈퍼마켓에서 허리케인 예보 때 가장 먼저 준비하는 물품. 양초도 성냥도 건전지도 아닌 튀김닭이란다. 그동안의 데이터가, 믿기지 않지만, 가장 많이 팔린 게 프라이드치킨이었단다. 남자와 여자가 겨울 부츠를 사는 패턴도 다르다. 9~10월 날씨가 선선해지면 여성용 부츠 판매량이 가파르게 증가한다. 남성용은 10~11월 정말로 날씨가 추워지고 습해져 양말이 젖을 때가 되어 비로소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