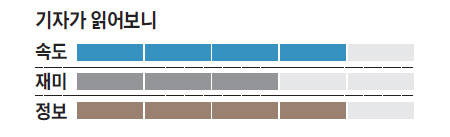의사들에게는 비밀이 있다
데이비드 뉴먼 지음ㅣ김성훈 옮김
알에이치코리아ㅣ352쪽ㅣ1만3000원
우리는 왜 항상 의사의 진료에 만족하지 못하는가. 의사와 환자는 영영 가까워질 수 없는 관계인가. 환자는 금성에서 왔고, 의사는 화성에서 왔단 말인가. 누구나 의사의 진료에 만족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 어쩌면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의 태도나 진료 방식에 매번 불만을 품고 돌아왔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절박함의 차이일 것이다. 아픈 사람은 늘 환자 쪽이다.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들의 태도가 건성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의사들은 환자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환부를 자세히 들여다보지도 않는다. 제대로 듣고 보지 않고서도 병에 대해 다 안다고 생각해서일까. 아니면 첨단 의료장비를 동원해서 검사의 투망을 던지면 될 것을, 굳이 환자의 몸을 만지고, 말을 나누는 데 시간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걸까.
현직 응급의학과 의사인 저자는 애초에 의료의 본질은 그렇지 않았다고 말한다. 의학은 기술이 아니라 예술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그 유래를 히포크라테스에서 찾는다. 히포크라테스는 환자를 볼 때마다 환자의 오줌을 맛보았다. 고름과 귀지를 채집했다. 대변의 냄새를 맡아 보고, 그 안을 자세히 뒤져 보기도 했다. 땀이 얼마나 끈적거리는지도 평가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진단과 치료 방법을 결정할 때는 환자의 식이 습관, 환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바람과 물, 환자가 사는 집의 방향도 고려했단다.
요즘 의사들이 히포크라테스의 진단 방법을 들으면 고개를 절레절레 저을 것이다. 근래에 그런 의사를 본 적이 있는 환자도 없을 것이다. 그만큼 의료도 병원도 바뀌었다. 의사들은 환자의 몸 상태를 효율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강변한다.

- Corbis / 토픽이미지
어디 이것뿐이랴. 뇌진탕이 일어날 때 왜 기억을 상실하거나 의식을 잃는지 아는가? 이 또한 저자의 물음이다. 세포 수준에서 뇌진탕의 실제 의미가 무엇인지 속시원히 아는 의사들은 없다. 의학이 인간 유전자 30억쌍 염기 서열을 파악한 게놈 지도를 완성하기까지 했지만, 아직 손가락 마디 꺾는 소리가 왜 나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손가락 마디 소리가 무슨 대수겠느냐마는, 저자는 의학이 밝히지 못한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를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며 보여준다. 거기에서 의사와 환자 간에 많은 오해와 불편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의사는 검사를 좋아한다" "의사마다 말이 다르다" "대화하지 않는 의사" "효과 없는 치료" 등 책의 목차만 보면 '의사들에게는 비밀이 있다'는 제목이 어울린다. 원제는 히포크라테스의 그늘(Hippocrates shadow)이다. 저자가 의사인 것으로 보아 의사 집단에 대한 내부 고발 서적처럼 보인다. 하지만 저자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니다. 병원의 비리를 고발하거나 현대 의학의 잠재력에 대한 환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자 이 책을 쓴 것이 아니다. 어떻게 의료와 의사가 고쳐지면, 우리의 삶과 생활이 어떻게 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서쯤 된다.
저자인 데이비드 뉴먼은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했고, 나중에 의사가 됐다. 근본이 인문학이다 보니, 무거운 주제를 소설처럼 풀어놨다. 병원과 세상이 마주치는 최전선, 응급실 의사이다 보니, 다양한 환자 사례를 통해 의학과 의료를 세상 이야기로 바꿔놨다. 책 속에 등장하는 환자 앨리스, 웬디 등은 우리 주변에서 복통 때문에 응급실을 찾았던 영철이 아빠, 영숙이 엄마 이야기다. 이제 다시 히포크라테스.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히포크라테스가 믿었던 의술은 잘못되거나 효과적이지 않은 것이 많다. 그러나 여전히 히포크라테스가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고, 그의 선서가 유효한 것은 환자를 대하는 히포크라테스의 진심 때문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조선 3013, 0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