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리커처=미디어카툰 정태권
캐리커처=미디어카툰 정태권
식도암 수술은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암 부위를 잘라 내고 위장을 가슴까지 올려 남은 부위와 잇는 수술 자체가 고난도인 데다 다른 암과 함께 발병하는 경우가 많아 더 복잡하다. 위에 암이 있으면 위 대신 대장을 연결해야 하고, 대장에도 암이 있으면 소장을 이어야 한다. 이어 놓은 부위가 썩으면 떼어 내고 다른 장기와 연결해야 한다. 가슴과 배 속의 장기 전체에 대해 통달해야 메스를 들 수 있다.
그래서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식도암은 의사들이 수술하기 겁내는 병이었다. 미국·영국·일본 등에서는 수술이 성공하고 있었지만 그야말로 먼 나라 이야기였다.
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 심영목(60) 교수는 1987년 군의관 근무를 마친 뒤 원자력병원에서 식도암과 폐암수술을 할지, K병원에서 심장수술을 맡을지 갈림길에서 고민하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선택했다.
막상 원자력병원에 가자 주위의 의사들이 “식도암을 수술하면 의사도 환자도 힘드니까 외래 환자가 오면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를 권하라”고 당연한 듯 충고했다. 그러나 ‘열혈 청년 심영목’은 이를 거부했다.
심 교수가 “외래 환자 안 보고 수술만 하겠다”고 선언하자 내과의사들은 ‘웃기는 청년’에게 환자를 보내지 않았다. 심 교수는 한동안 텅 빈 진료실과 수술실을 오가며 ‘이미지 훈련’을 하면서 환자를 기다렸다. 그는 내과의사들에게 “식도암 환자의 수술 사망률을 5% 이하, 5년 생존율을 30%로 유지할 자신이 있으니 환자를 보내 달라”고 읍소했다. 당시 식도암 수술 분야에서 최고 수준을 자랑하던 영국 유명 병원도 5년 생존율이 1980년대 4~5%에 불과했고 90년대 들어 겨우 20%가 됐다. 심 교수는 원자력병원에 간 지 3개월 만에 만난 첫 환자의 수술에서 성공했다.
92년 대한흉부외과학회에서 5년 동안 수술한 300여 명의 사례를 발표하자 모두가 탄성을 질렀다. 당시 서울대병원 노준량 교수는 “우리도 최근 들어 수술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10년 동안 100명도 수술하지 못했는데 대단하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삼성서울병원으로 자리를 옮기고 나서 지금까지 2000여 명의 환자를 수술했다. 5년 생존율은 55%로 일본의 최고 병원인 국립암센터에 버금간다.
심 교수는 2008년 삼성암센터 초대 원장을 맡아 올해 암병원으로 승격시켰다. 그는 해마다 “올해는 환자 수를 반으로 줄이고 통증 없는 암병원을 만드는 데 주력하자”고 다짐하지만 매번 구두선(口頭禪)에 그치고 있다. 전국 의사들이 보내오는 환자를 거절할 수 없어 매년 오히려 환자가 늘고 있다.
환자가 몰리다 보니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수술에 성공한 사례도 많다. 양잿물을 마셔 목구멍 입구가 붙어 버린 환자의 목 구조 전체를 떨어뜨린 다음 식도 아랫부분을 자르고 대장에 연결한 수술은 2005년 미국 흉부외과학회지에 게재돼 호평을 받았다. 식도 재건수술에 실패해 겨드랑이에 튜브를 꽂고 영양 공급을 받던 환자에게 독특한 방법으로 ‘밥줄’을 만들어 준 사례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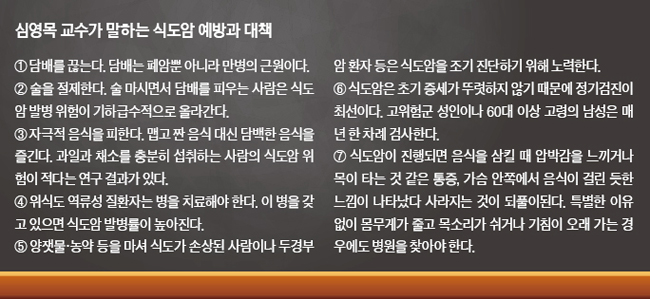
심 교수는 최근에는 한 해 40여 명에게 로봇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기존 흉강경수술은 배를 10㎝ 정도 절개하고 겨드랑이 아래에 구멍을 4~5개 낸 다음 내시경과 수술장비를 넣어 수술한다. 로봇수술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목에 3~4㎝ 정도 절개를 더 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통증이 적고 호흡기 장애가 덜한 장점이 있다.
심 교수는 “흉부외과 의사는 삶과 죽음에 담대해야 한다. 환자가 죽는데도 개의치 않고 자신의 이익만 고집하는 건 문제겠지만 어쩔 수 없는 실패에 얽매이면 더 많은 환자를 살릴 수 없게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수술 후 끝내 암을 못 이기고 세상을 떠난 환자들이 눈에 밟히는 걸 피할 순 없다. 그는 10여 년 동안 삼성서울병원 산악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매년 몇 차례 후배와 제자 의사들을 데리고 백두대간을 향한다. 산에서 아픔을 내려놓고 새 환자를 수술할 기운을 얻어 병원으로 되돌아온다.